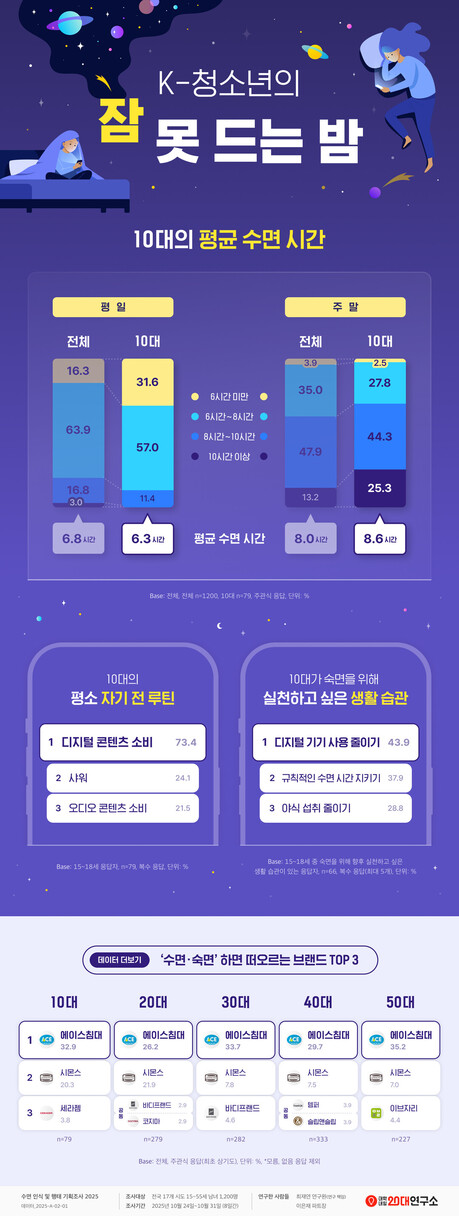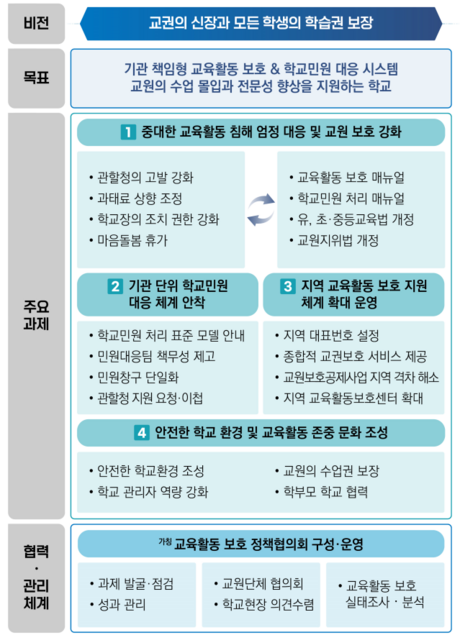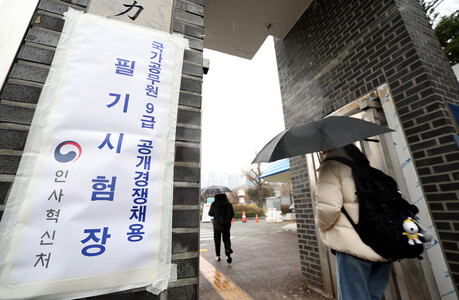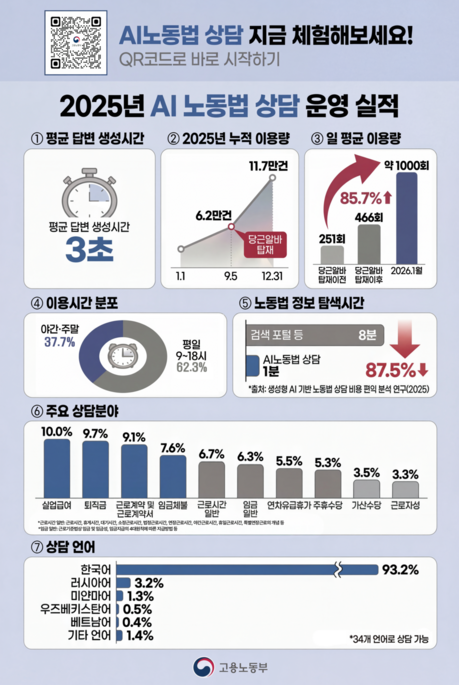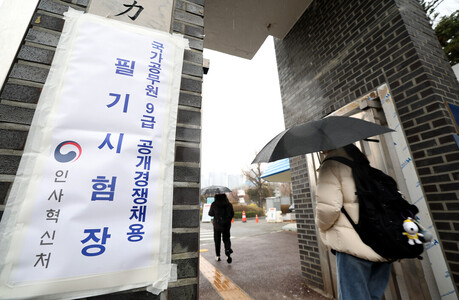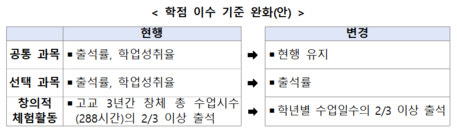종이
–에세이로 포엠하다
 |
붓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유는 잠시 후 알게 됩니다.
나의 돌잡이 땐 손바닥으로 잡았고, 홍역을 앓고 나선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붓은 나의 열한 번째 손가락이자 뿔이나 수염 같은 제이의 두뇌로 확고히 자리했습니다.
나를 무에서 유로 이끈 도구요 찬란한 역사의 귀퉁이에 한자리를 마련해 준 선생입니다.
펜에 잉크를 찍어 하루 여덟 시간씩 16절 갱지를 채우던 시절, 아버지의 손가락은 늘 푸른 멍이 들었지요.
나는 공책을 빼곡히 채울 내일의 연필 대여섯 자루를 뾰족하게 깎아 필통에 가지런히 챙깁니다.
이 일을 마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연필 시대가 가고 중학생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만년필이 일부 대중화되어 아버지는 더 이상 손가락에 잉크를 묻히지 않게 되었지만, 나에게는 꿈에도 나타나는 새로운 문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제 P 만년필 뚜껑을 몰래 열고 몇 자 끄적였을 때 종이 위를 미끄러져 내리는 부드러운 필기감의 흥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모를 리 없었죠. 나에게도 드디어 만년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베푼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비록 조악한 품질의 국산 만년필이었지만, 수업 중에 공연히 만년필 촉을 뺐다 끼웠다 하고 수시로 닦고 문지르는 나를 보고 “너 차라리 학교 다니지 말고 시장통에서 만년필 수리공이나 해라”며 선생님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만년필이 혁신의 실사구시였다면 볼펜의 등장은 미래의 그림자였습니다.
볼펜은 재래식 필기의 번거로움, 비 실용성, 속도 등을 일시에 개선한 획기적 발명품이었으니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모습을 달리한 이런 붓들은 종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성립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천 쪽의 저작물, 신문, 잡지, 문서, 통신문 등이 화상(畫像) 제작되어 순간 전파되고 소비됩니다.
뿐입니까? 붓을 대신하는 입, 말하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척척 문장을 생산해 주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종이가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신우일신이라 하지만 메커니즘의 또 다른 모습, 단절되는 과거의 그림자를 보듯 불안의 엄습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인문학의 시체를 밟고 아쿠아리어스(Aquarius)나 버고(Virgo) 그리고 라이브라(Libra) 같은 별자리로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종이로 만든 옷을 이미 목격한 내가 종이로 만든 건축물이나 자동차나 비행기가 출현한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그 종이와 이 종이의 의미는 18세기와 21세기의 간극과 격차 같은 것입니다.
이미 남루해진 종이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희망 사항에도 있지 않습니다.
천직인 속기사 일을 때려치우고 화목을 연료로 쓰는 부엌에서의 요리처럼 불편하고 또 불편해도 ‘잉크에 펜을 찍어 원고지를 채우는 일’을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나무가 옹이의 흔적 없이 가지를 뻗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